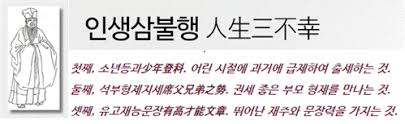소년등과일불행(少年登科一不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oonkok711 작성일 25-04-20 07:35 조회 15 댓글 0본문
소년등과일불행(少年登科一不幸)
중국 송(宋)나라 학자 정이천(程伊川)의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불행이 있다.
젊은 나이로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이 첫 번째 불행이요,
부모의 권세에 힘입어 좋은 벼슬을 얻는 것이 두 번째 불행이요,
재능이 뛰어나고 글 솜씨가 좋은 것이 세 번째 불행다.
소학(小學)에 나오는 말입니다.
젊어서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거둔 성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큰 성공에 욕심을 내는 출세지향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로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이 첫 번째 불행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부모의 도움을 바라곤 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면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세에 힘입어 좋은 벼슬을 얻는 것이 두 번째 불행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면 노력을 게을리 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도 이를 뒷받침하는 노력이 없다면 재능을 꽃 피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뛰어나고 글 솜씨가 좋은 것이 세 번째 불행입니다.
젊은 나이로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 부모의 권세에 힘입어 좋은 벼슬을 얻는 것, 타고난 재주가 뛰어나고 글 솜씨가 좋은 것, 당장은 행운처럼 보일지 몰라도 길게 보면 모두 불행입니다.
소년등과(少年登科) 부득호사(不得好死)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년시절에 과거에 합격하면 좋게 죽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스무 살이 채 안 된 나이에 출세해 버리면 뒤끝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옛 사람들은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벼슬을 하거나 재물을 많이 얻거나 성공하는 일을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人生事라는 게 전반전이 좋으면 후반전이 좋지 않기 마련입니다.
끝까지 계속 좋은 사람은 아주 드믑니다.
더구나 젊어서 출세하면 십중팔구 거만해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일찍 출세했으니 모두가 부러워했을 것이고 최고의 경지로 높이 받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옛사람들은 인간의 세 가지 불행 중 첫 번째로 소년등과(少年登科)를 꼽았다. 소년등과일불행(少年登科 一不幸)이라 하여 소년등과하면 불행이 크다거나
소년등과 부득호사(少年登科 不得好死)라 하여, 소년등과한 사람이 좋게 죽은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고, 소년등과 패가망신(少年登科 敗家亡身)이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맹자는 진예자 기퇴속(進銳者 其退速) 즉 나아가는 것이 빠른 자는
그 물러남도 빠르다고 빨리감을 경계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 출세하면 나태해지고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나태해지면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오만하면 적이 많아집니다.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일찍 출세하면 나태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다는 말이며 나태해지면 자신의 발전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고 오만해지면 주위의 질시와 적이 많아져서 자신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말입니다.
특히 경계해야할 일은 너무 어린 성취로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거나
배우기를 게을리 하여 진취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렵고 종국에는 이른 출세가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아마도 선인(先人)들은 수많은 사례를 경험한 끝에 이런 격언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소년등과가 나쁘다기보다 너무 이른 성취로 학업을 폐하여 더 이상 진취가 없게 됨을
경계한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크고 작은 굴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 가장 큰 성취는 이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20대 후반에는 남보다 훨씬 잘나갔다고 자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젊은이들이 소년등과를 부러워하고, 잠정적인 실패에 좌절하며
잠깐의 뒤처짐에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대의 전성기는 아직 멀리 있습니다.
정조 14년 황사영은 17세에 사마시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는데
이에 정조는 어린 사영을 불러 손을 잡으면서 네 나이 20세가 되거든 짐을 찾아오너라. 짐이 너를 꼭 등용하고 싶다고 하여 황사영의 출세를 임금이 보장하였다 합니다.
40대의 정약현은 자신의 딸과 결혼할 어린 사윗감 황사영을 불러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사윗감을 본 첫 마디는 소년등고(少年登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황사영은 어린 나이에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일과 재주가 좋아서 문장을 잘 짓는 일이 인간의 큰 불행이라는 소학의 말을 떠 올리면서 겸손함을 배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조선초 남이 장군도 16세 (세조 3년)에 무과에 급제했고 26세에 반란진압으로 1등 공신에 책봉되었으며 (세조 13년) 이듬해 병조판서가 되었지만 몇 달 뒤 모함에 휘말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찍 성공하게 되면 자만하게 되고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알기 전에 자만부터 배우게 되고,
그래서 만용을 부리다 실패하게 됩니다.
인생은 좀 더 멀리 보고 갈 일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관 뚜껑을 닫기 직전에 결정됩니다.
조금 빠르다고 자만하지 말고 조금 늦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생각했던 것 보다 내가 다소 뒤쳐졌더라도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딛고 마지막에 자기만의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둘째는 가문의 도움으로 좋은 벼슬에 오르면 애쓰지 않고 남이 못하는 것을
누리다보니 그 위치가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자리인지 몰라서 함부로 굴다가 제풀에 무너집니다.
셋째는 재주가 높고 문장마저 능한 것입니다. 거칠 것이 없고 꿀릴 데가 없습니다.
실패를 모르고 득의양양하다가 한 순간에 나락에 굴러 떨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선망하는 것인데 선인들은 오히려 이를 경계했다.
차도 넘치지 않고 높아도 위태롭지 않으려면 자신을 낮추고 숙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김일손(金馹孫)은 잘나가던 이조좌랑을 사직하고 사가독서(賜暇讀書)를 청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는 옛사람이 경계한 소년등과 일불행이 바로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며 너무 젊은 나에게 요직을 두루 거쳐 큰 은총을 입었으니 이쯤에서
그치고 독서로 자신을 충전하겠다며 사직을 간청했습니다.
민영환(閔泳煥)이 규장각 대교에 임명되자 역량이 안 되니 취소해 달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직임이 화려할수록 졸렬함이 더 드러나고 돌아보심이 두터울수록 송구함만 늘어갑니다. 주제넘게 차지하고서도 당연히 온 것으로 여기고 감사히 받드는 것을 본래 있던 것처럼 할 수 없어 진심으로 우러러 성상께 아룁니다.
바라옵건데 굽어 살펴 속히 신에게 제수하신 직책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가득함을 경계하는 선인들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젊은 날의 빠른 성취는 부러워할 일이 못 된다. 살얼음을 밟듯 전전긍긍해야 할 일입니다.
만초손 겸수익(滿招損 謙受益)이란 〈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겸손함은 스스로 만족함을 알아 절제하는 것이고,
교만함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 탐욕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높이려고만 하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낮추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부를 누리게 된 사람일수록 자신을 절제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만하면 부지불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존경이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지위 여하를 떠나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야말로 필요한 덕목임을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일,
품격 있는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일,
스스로는 물론 남도 높여주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 또한 군자의 풍모 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사람을 잃고, 스스로를 낮추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존중이란 구걸하듯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얻어집니다.
손자 <군쟁편> 에‘우직지계(迂直之計)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까운 길을 곧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병법의 지혜입니다.
군쟁(軍爭)의 어려움은 돌아가는 길을 직행하는 길인 듯이 가고,
불리한 우환을 이로움으로 만드는 데 있다.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게 느껴지겠지만
결국은 먼저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먼 길을 우회해 돌아가면서도 오히려 지름길로 간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곤란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반전시키는
우직지계의 삶이 ‘우회축적(迂廻蓄積)’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힘을 축적함으로써
나중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세상도 알고 보면 직선과 곡선이 조합된, 사실상의 곡선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성공을 위한 전략도 수천 년 전부터
이리저리 돌아가는 곡선이 대세였습니다.
중국 송(宋)나라 학자 정이천(程伊川)의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불행이 있다.
젊은 나이로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이 첫 번째 불행이요,
부모의 권세에 힘입어 좋은 벼슬을 얻는 것이 두 번째 불행이요,
재능이 뛰어나고 글 솜씨가 좋은 것이 세 번째 불행다.
소학(小學)에 나오는 말입니다.
젊어서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거둔 성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큰 성공에 욕심을 내는 출세지향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로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이 첫 번째 불행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부모의 도움을 바라곤 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면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세에 힘입어 좋은 벼슬을 얻는 것이 두 번째 불행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면 노력을 게을리 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도 이를 뒷받침하는 노력이 없다면 재능을 꽃 피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뛰어나고 글 솜씨가 좋은 것이 세 번째 불행입니다.
젊은 나이로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 부모의 권세에 힘입어 좋은 벼슬을 얻는 것, 타고난 재주가 뛰어나고 글 솜씨가 좋은 것, 당장은 행운처럼 보일지 몰라도 길게 보면 모두 불행입니다.
소년등과(少年登科) 부득호사(不得好死)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년시절에 과거에 합격하면 좋게 죽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스무 살이 채 안 된 나이에 출세해 버리면 뒤끝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옛 사람들은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벼슬을 하거나 재물을 많이 얻거나 성공하는 일을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人生事라는 게 전반전이 좋으면 후반전이 좋지 않기 마련입니다.
끝까지 계속 좋은 사람은 아주 드믑니다.
더구나 젊어서 출세하면 십중팔구 거만해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일찍 출세했으니 모두가 부러워했을 것이고 최고의 경지로 높이 받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옛사람들은 인간의 세 가지 불행 중 첫 번째로 소년등과(少年登科)를 꼽았다. 소년등과일불행(少年登科 一不幸)이라 하여 소년등과하면 불행이 크다거나
소년등과 부득호사(少年登科 不得好死)라 하여, 소년등과한 사람이 좋게 죽은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고, 소년등과 패가망신(少年登科 敗家亡身)이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맹자는 진예자 기퇴속(進銳者 其退速) 즉 나아가는 것이 빠른 자는
그 물러남도 빠르다고 빨리감을 경계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 출세하면 나태해지고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나태해지면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오만하면 적이 많아집니다.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일찍 출세하면 나태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다는 말이며 나태해지면 자신의 발전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고 오만해지면 주위의 질시와 적이 많아져서 자신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말입니다.
특히 경계해야할 일은 너무 어린 성취로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거나
배우기를 게을리 하여 진취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렵고 종국에는 이른 출세가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아마도 선인(先人)들은 수많은 사례를 경험한 끝에 이런 격언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소년등과가 나쁘다기보다 너무 이른 성취로 학업을 폐하여 더 이상 진취가 없게 됨을
경계한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크고 작은 굴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 가장 큰 성취는 이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20대 후반에는 남보다 훨씬 잘나갔다고 자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젊은이들이 소년등과를 부러워하고, 잠정적인 실패에 좌절하며
잠깐의 뒤처짐에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대의 전성기는 아직 멀리 있습니다.
정조 14년 황사영은 17세에 사마시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는데
이에 정조는 어린 사영을 불러 손을 잡으면서 네 나이 20세가 되거든 짐을 찾아오너라. 짐이 너를 꼭 등용하고 싶다고 하여 황사영의 출세를 임금이 보장하였다 합니다.
40대의 정약현은 자신의 딸과 결혼할 어린 사윗감 황사영을 불러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사윗감을 본 첫 마디는 소년등고(少年登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황사영은 어린 나이에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일과 재주가 좋아서 문장을 잘 짓는 일이 인간의 큰 불행이라는 소학의 말을 떠 올리면서 겸손함을 배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조선초 남이 장군도 16세 (세조 3년)에 무과에 급제했고 26세에 반란진압으로 1등 공신에 책봉되었으며 (세조 13년) 이듬해 병조판서가 되었지만 몇 달 뒤 모함에 휘말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찍 성공하게 되면 자만하게 되고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알기 전에 자만부터 배우게 되고,
그래서 만용을 부리다 실패하게 됩니다.
인생은 좀 더 멀리 보고 갈 일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관 뚜껑을 닫기 직전에 결정됩니다.
조금 빠르다고 자만하지 말고 조금 늦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생각했던 것 보다 내가 다소 뒤쳐졌더라도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딛고 마지막에 자기만의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둘째는 가문의 도움으로 좋은 벼슬에 오르면 애쓰지 않고 남이 못하는 것을
누리다보니 그 위치가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자리인지 몰라서 함부로 굴다가 제풀에 무너집니다.
셋째는 재주가 높고 문장마저 능한 것입니다. 거칠 것이 없고 꿀릴 데가 없습니다.
실패를 모르고 득의양양하다가 한 순간에 나락에 굴러 떨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선망하는 것인데 선인들은 오히려 이를 경계했다.
차도 넘치지 않고 높아도 위태롭지 않으려면 자신을 낮추고 숙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김일손(金馹孫)은 잘나가던 이조좌랑을 사직하고 사가독서(賜暇讀書)를 청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는 옛사람이 경계한 소년등과 일불행이 바로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며 너무 젊은 나에게 요직을 두루 거쳐 큰 은총을 입었으니 이쯤에서
그치고 독서로 자신을 충전하겠다며 사직을 간청했습니다.
민영환(閔泳煥)이 규장각 대교에 임명되자 역량이 안 되니 취소해 달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직임이 화려할수록 졸렬함이 더 드러나고 돌아보심이 두터울수록 송구함만 늘어갑니다. 주제넘게 차지하고서도 당연히 온 것으로 여기고 감사히 받드는 것을 본래 있던 것처럼 할 수 없어 진심으로 우러러 성상께 아룁니다.
바라옵건데 굽어 살펴 속히 신에게 제수하신 직책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가득함을 경계하는 선인들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젊은 날의 빠른 성취는 부러워할 일이 못 된다. 살얼음을 밟듯 전전긍긍해야 할 일입니다.
만초손 겸수익(滿招損 謙受益)이란 〈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겸손함은 스스로 만족함을 알아 절제하는 것이고,
교만함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 탐욕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높이려고만 하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낮추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부를 누리게 된 사람일수록 자신을 절제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만하면 부지불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존경이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지위 여하를 떠나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야말로 필요한 덕목임을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일,
품격 있는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일,
스스로는 물론 남도 높여주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 또한 군자의 풍모 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사람을 잃고, 스스로를 낮추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존중이란 구걸하듯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얻어집니다.
손자 <군쟁편> 에‘우직지계(迂直之計)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까운 길을 곧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병법의 지혜입니다.
군쟁(軍爭)의 어려움은 돌아가는 길을 직행하는 길인 듯이 가고,
불리한 우환을 이로움으로 만드는 데 있다.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게 느껴지겠지만
결국은 먼저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먼 길을 우회해 돌아가면서도 오히려 지름길로 간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곤란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반전시키는
우직지계의 삶이 ‘우회축적(迂廻蓄積)’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힘을 축적함으로써
나중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세상도 알고 보면 직선과 곡선이 조합된, 사실상의 곡선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성공을 위한 전략도 수천 년 전부터
이리저리 돌아가는 곡선이 대세였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